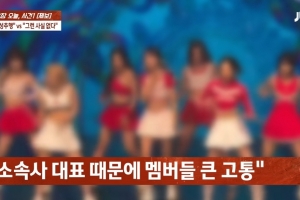고타마 싯다르타는 본격적으로 구도에 오르기 위해 29살에 출가했다. 그후 6년간 고행한 싯다르타가 부다가야의 큰 보리수 아래 좌정한 채 깊은 명상에 들었다가 이윽고 새벽녘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밝은 별(明星)’ 하나가 미명의 동녘 하늘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 순간 싯다르타는 크게 깨치고 정각(正覺)에 이르러 붓다(깨달은 자)가 되었다.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 진리를 설한 것은 바로 이 성도(成道)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새벽별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은 싯다르타는 다음과 같은 게송을 남겼다. 게송이란 수행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었다든가, 법문을 설할 때 일어난 감흥을 한시 형태로 읊은 것이다.
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으나/깨닫고 난 뒤에는 별이 아니다/사물을 좇아가지는 않지만/그렇다고 무정물도 아니다(因星見悟 悟罷非星 不逐於物 不是無情)
이 게송을 두고 예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해석들을 내놓았다. 대체적인 풀이는 ‘새벽의 별을 본 것이 깨달음의 계기가 되었다. 깨달은 후 보니 그 별은 이미 별이 아니다. 그것은 사물이 아니라 유정물이요 자신이요 우주다’란 것이다.
중국 오대 때의 큰스님 취암(翠巖)이 붓다의 새벽별 게송을 해석한 또 다른 게송을 내놓았다.
한번 밝은 별을 보고 꿈에서 깨어났네/천년 묵은 복숭아씨에서 푸른 매실이 열렸도다/비록 국에 넣어 맛을 내진 못하지만/일찍이 목마른 장병들의 갈증은 덜어줬네(一見明星夢便廻 千年桃核長靑梅 雖然不是調羹味 曾與將軍止渴來)
또 다른 해석은 싯다르타가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 끝에 새벽하늘의 명성을 보고 자신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올라타고 태양을 빙빙 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풀이한다. <화엄경>에는 이와 관련하여 ‘기세간(器世間)’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다. 기세간이란 사람이 사는 ‘그릇(器)’이라는 뜻으로, 곧 지구를 가리킨다. 석가는 새벽별을 보고는 문득 자신이 살고 있는 그릇이 허공에 둥둥 떠서 굴러가는 그릇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붓다의 지동설 우주관이라 할 수 있다.
서양의 아리스타르코스(BC 310-230)가 최초로 지동설을 내놓은 것이 기원전 3세기다. 그렇다면 붓다는 그보다 300년이나 앞서 지동설을 깨쳤다는 건데,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다. 부처님도 당시에는 이 별이 쌍성인 줄은 몰랐을 것이다.
샛별이냐, 시리우스냐?
어쨌든 부처님이 새벽에 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기록에 나타나 있는 사실인데, 현대 천문학에서 볼 때 과연 그 별이 무슨 별이었을까? 일단 금성이 용의 선상에 떠오른다. 기원전 5~6세기인 그 시절에 행성과 항성(별)의 구분이 딱히 있었을 것 같지 않고, 또 싯다르타가 동쪽 하늘에서 보았다는 밝은 별로는 금성 외에는 찾기가 어렵다.
금성은 우리나라에서 예부터 아침에 뜰 때는 샛별 또는 명성(明星), 계명성(啓明星)이라 하고, 저녁에 서쪽 하늘에 뜰 때는 개밥바라기라 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에 나타나는 금성을 서로 다른 두 개의 천체라고 생각했다. 붓다의 정확한 생몰 연도와 날짜는 모른다. 주류 역사가들은 대체로 기원전 563년 무렵에 태어나 기원전 483년 무렵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부처의 탄생과 열반을 기원전 624년, 544년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한 별지기는 대략적인 성도일(成道日)을 추산하여 35세 되는 해인 기원전 589년 12월 8일(음력) 이른 새벽, 위치를 부다가야 근처 가야시로 설정하고 해당날짜로 스카이사파리 앱을 돌려 검토해본 결과, 그날은 달이 없는 날이고 새벽녘에 가장 밝은 별은 시리우스로 나왔다. 전천에서 가장 밝은 별로, 동양에서는 천랑성(天狼星) 또는 늑대별, 서양에서는 개별(dog star)이라고 불렸다. 고대 이집트에서 이 별이 동쪽 지평선 위로 나타나면 나일강의 범람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집트 태양력은 이날을 1월 1일로 삼았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처님이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 별’은 행성인 금성이거나 정말 별인 시리우스 중 하나일 것이 거의 분명하다. 어쨌든 새벽 하늘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명성’을 본 그 순간, 부처님은 이 광대무변한 우주를 문득 체득하고, 무시무종(無始無終)의 영겁을 깊이 체감하고는, 별과 나, 세계와 나는 하나이며,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치지 않았을까 싶다. 이는 현대 천문학 이론에도 합이 맞는 사상이다.
여기서 부처님의 큰 가르침 ‘살아 있는 모든 중생을 사랑하라’는 대자대비(大慈大悲)가 나오지 않았을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이것은 바로 사랑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감히 인류를 사랑한다고 말할 배짱은 없을지라도, 바로 당신 옆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게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 이 어마무시하게 광막한 우주에 한낱 별먼지로 이루어진 인간이 맞설 수 있는 단 하나의 무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까? 사랑만이 생과 사, 시공을 초월하는 유일한 거니까.
몇 해 전 우주로 떠난 휠체어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면, 우주도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It would not be much of a universe if it wasn‘t home to the people you love)”
이광식 과학 칼럼니스트 joand9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