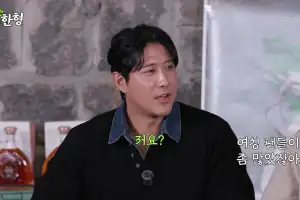여배우 윤정희(66)는 예쁘고 우아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다며 악수를 청하는 손동작, 재미난 이야기에 쉬이 터뜨리는 낭랑한 웃음, 질문을 경청하는 진지한 표정까지. 1960·70년대를 사로잡았던 윤정희의 미모는 2010년의 봄에도 여전히 빛을 발했다.
‘은막의 여왕’, ‘여배우 트로이카’…. 그녀를 지칭하는 수많은 수식어처럼 윤정희는 한국 영화사 속에서 피어난 최고의 스타였다. 이후 16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온 윤정희는 이창동 감독의 ‘시’로 국내와 프랑스 칸에서 ‘여왕의 대관식’을 치렀다.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전 세계인들에게 ‘칸의 여왕’으로 기억될 윤정희. 세련된 파리지엔이자 영원히 여배우일 수밖에 없는 그녀를 만났다.
◆ 칸의 여왕: 전도연과 경쟁? 싫은데…
윤정희가 칸 국제영화제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다른 이유로(남편이자 피아니스트인 백건우의 연주회나 여행 등) 이 아름다운 프랑스 남부의 휴양도시를 찾은 적은 있지만 “영화제 기간에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다.”고 윤정희는 밝혔다.
“영화제 기간이 아닐 때 칸 영화제가 열리는 뤼미에르 극장을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무척 소박한 곳인데, 그토록 화려한 영화 축제의 무대가 되는 것은 세계적인 감독들과 훌륭한 배우들 덕분이겠죠. 이번 기회에 유명한 영화인들과 교류할 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쁘답니다.”
올해 제63회 칸 영화제에는 유난히 한국영화들의 진출이 눈에 띈다. 특히 윤정희가 주연한 ‘시’와 2007년 ‘칸의 여인’으로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전도연의 ‘하녀’는 공식 경쟁부문에서 경합을 벌이게 됐다.
이에 언론과 영화인들의 시선은 윤정희와 전도연의 여우주연상 수상 여부와 여배우들의 경쟁에 온통 집중됐다. 하지만 윤정희는 “나는 경쟁이라는 단어가 정말 싫다.”고 딱 잘라 말했다.
“물론 상을 받으면 무척 기쁠 겁니다. 하지만 난 이에 대해 그 어떤 기대도 품지 않아요. 칸 영화제가 나의 ‘시’를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우니까, 이 즐거움을 즐길 뿐이에요. 수상 여부가 부담스럽고 두렵다면 영화제에 가지 말아야죠.”
◆ 파리지엔: 내 스타일리스트는 남편 백건우
이날 우아한 블랙 컬러의 재킷과 그레이 컬러의 스카프를 매치한 윤정희는 여배우의 아우라를 후광처럼 걸치고 있었다. 정말 아름답고 스타일리시하다는 기자의 말에 윤정희는 “남편인 백건우 씨가 사준 옷”이라며 수줍게 웃었다.
“백건우 씨와 나는 음악회든 영화든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서로 매니저가 따로 있지만, 스케줄을 챙기고 옷차림을 봐주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64)와 세기의 결혼식을 올린 윤정희는 30년 넘게 프랑스 파리에 거주해온 ‘파리지엔’(Parisienne)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윤정희는 영화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자연스럽고 스타일리시했다.
“내가 한창 활동했던 당시에는 ‘스타일리스트’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배우들이 의상을 직접 골랐어요. 난 결혼한 후에도 작품을 20편 이상 했는데, 남편과 함께 장면에 맞는 옷과 액세서리를 함께 찾아다니곤 했죠. 백건우 씨는 자상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답니다.” (웃음)
이번 칸 영화제의 레드카펫에 선 윤정희는 푸른 한복 저고리와 보랏빛 치마를 입고 한국 여배우의 위상과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전했다. 윤정희가 입은 이 한복 역시 색상과 디자인을 백건우와 함께 고른 것으로 알려져 깊은 부부애를 드러냈다.
서울신문NTN 박민경 기자 minkyung@seoulntn.com / 사진=한윤종 기자
[→(인터뷰②) 윤정희 “난 영원한 여배우, ‘詩’를 기다렸을 뿐…”에서 계속]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