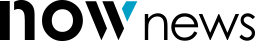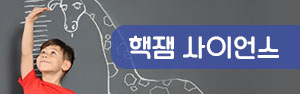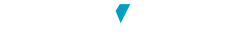징크스는 고대 그리스에서 마술에서 사용됐던 딱따구리 일종인 개미잡이(wryneck/Jynx torquilla)라는 새 이름에서 유래한다. 불길한 징후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불길한 대상이 되는 사물 또는 현상이나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운명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사람들과 사이에서 불길한 징후가 있을 때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는 인과 관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다. 그러나 월드컵에서 보여줬듯이 무엇인가 골대 맞고 골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간발의 차이로 골인되지 않았으므로 골대를 맞춘 선수나 그 팀을 응원하는 사람에게는 기분 나쁜 일임은 분명하다. 이런 현상이 각인되고 반복되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게 된다는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게 되며 이에 따른 규칙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어떤 현상에 대한 징크스란 것이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징크스에 공식이 들어가게 되면 이를 당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징크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불필요하게 힘이 들어가게 되고 동작이 커지게 되면서 주변에 대한 경계심이 보다 더 커지게 되면서 예민해진다. 주변에 대해 예민해지면 불필요하게 주변 상황에 민감해져 일에 대한 집중력이 분산되어 경기나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몰입을 떨어뜨린다. 이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융통성 있게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다보면 다시 결과는 나쁘게 되고 역시 징크스 때문에 되지 않아 하면서 징크스는 되풀이 된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 불길하다는 잘못된 믿음이 보다 더 강화될 수 있다.
징크스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이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 수고가 들어간다. 그러나 징크스는 깨지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처럼 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승부나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포기하던 일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징크스를 깬다는 것은 자신 내부에 존재하는 불안감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징크스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경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감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번 월드컵에서 16강전에서 패배한 것은 골대 징크스 이외에 심판의 석연치 않은 판정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월드컵 덕분에 보름동안 행복했고 4년 뒤 브라질 대회도 있다. 이때에도 우리나라가 월드컵 대회 본선에 나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길 바란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불길한 징조가 있어 실패하더라도 징크스 탓으로 돌리기 전 이를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하면 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기 마련이다. 이런 것이 반복된다면 불길한 징조가 아닌 좋은 징조로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징크스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닌 자신 내부에 있는 불안감일 뿐이다.
사랑샘터 소아정신과 원장 김태훈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