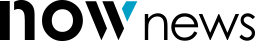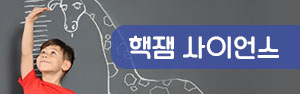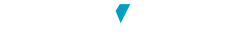광섬유는 데이터 전송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에 축복과도 같은 발명품이다. 좀 더 정확하게는 광통신이라고 해야겠지만 아무튼 얇은 광섬유 한 가닥으로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손쉽게 지구 어느 곳에나 전송할 수 있게 된 것은 현대 문명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기가비트(gigabit)급 인터넷 서비스까지 선보일 수 있는 건 광섬유의 발명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가비트급 통신이나 10 Gbps 급 속도를 보이는 USB 3.1, 그리고 그보다 더 빠른 속도를 보장하는 썬더볼트(Thunderbolt) 같은 규격은 급격히 증가하는 데이터에 따른 시대적 변화이지만 사실 기업 및 대규모 데이터 센터(IDC)들에서는 더 강력한 수단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기가비트를 뛰어넘는 테라비트(terabit)급이나 그 이상의 속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미 인텔과 코닝 같은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MXC 커넥터라는 새로운 규격을 만들었는데 이는 25 Gbps 급 전송규격의 광섬유를 16 X 4 방식으로 배열해서 한 방향으로 800 Gbps, 양방향으로 1.6 Tbps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이 광섬유에는 코닝의 ClearCurve Fiber가 사용된다.
이 규격을 준수하는 광섬유는 2014년 2분기와 3분기에 순차적으로 파트너들에 의해서 양산이 시작되었는데 미래의 표준으로 보급될지는 아직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1 Tb 이상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규격 단자와 케이블은 이미 현재 진행형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초당 255 '테라비트'까지 성공
한편 이미 한 가닥의 광섬유에서 테라비트급 데이터 전송에 성공한 것은 좀 지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올해 중순에 카를스루헤 공과대학 (Karlsruhe Institute for Technology) 연구팀은 일본의 NTT 에서 개발한 특수한 광섬유를 이용해서 무려 초당 43 테라비트(43 Terabits per second)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기록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1 초에 5 TB 가 넘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 기록이지만 올해가 채 지나기도 전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대학 (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 TU/e)과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CREOL)의 연구자들은 네이처 포토닉스(Nature Photonics)에 새로운 멀티코어 광섬유를 이용해서 무려 초당 255 테라비트(255 Terabits per second)의 새로운 기록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 광섬유는 지름 200 미크론 정도로 기존의 통신용 광섬유보다 엄청나게 많이 굵지는 않지만 (참고로 MXC 규격 광섬유의 지름은 180 미크론이다) 사실은 멀티코어 광섬유(multicore fiber)로 내부에 7 개의 코어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다 각 코어당 3 개의 데이터 전송 통로를 지니고 있다. 연구팀은 이 광섬유와 기존의 광섬유를 비교하면 1차선 도로에 한대의 차가 다니는 경우와 7차선 도로에 3대씩 차가 다니는 것을 비교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즉 비교도 안되게 데이터 수송량이 많다는 것이다.
-유럽연합 차세대 과학기술 '호라이즌 2020'의 목표
초당 255 테라비트라는 기록을 달성했다면 다음 단계는 페타비트라는 걸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마지막에 언급한 연구는 유럽연합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차세대 과학기술인 호라이즌 2020(Horizon 2020) 연구 계획의 목표이기도 하다. 즉 초당 페타비트급 광통신 기술을 앞으로 6 년 이내에 개발하는 것이다.
물론 이 목표가 매우 야심찬 것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기술발전 속도를 볼 때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솔직히 말한다면 이제는 매우 근접한 목표로 보인다. 그러데 사실 이렇게 빠른 광통신을 수용할 만큼 빠른 저장장치도 없을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연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역시 미래를 위한 대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데이터 전송량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머지않아 기가비트조차 구시대의 유물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56 kbps 모뎀의 추억을 떠올리면 사실 그때에서 지금까지 오는데 몇십 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향후 막대한 데이터 폭증에 대비함과 동시에 비용절감(백 개의 광섬유가 할 일을 하는 한 개의 광섬유라면 10배 비싸도 10배 정도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다)과 그린 IT를 위한 에너지 절감(역시 같은 논리로 사용되는 케이블의 수가 적으면 에너지 소모도 적을 수 밖에 없음)을 이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기술적 허용하는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연구는 계속될 것이다.
고든 정 통신원 jjy0501@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