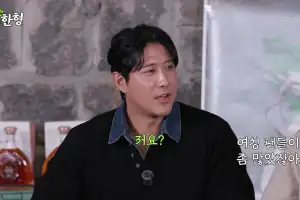세르비아의 재활학과 전문의인 미라 스타노즈시크(64)는 60년이 넘도록 여성으로 살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어떤 의문도 갖지 않았으며 여성으로서의 삶에 만족해왔지만, 최근 ‘늦깎이 성전환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정년퇴임 시기 때문이다.
세르비아는 남자 65세, 여자 60.5세를 정년 시기로 규정해왔고 여성의 경우 자신이 원한다면 정년을 넘겨도 일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법률이 제정되면서 60.5세가 넘은 여성도 ‘강제로’ 퇴직해야 하는 위기에 놓였다. 여성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세르비아 헌법재판소가 법의 효력을 보류한 상태지만, 그렇다고 스타노즈시크의 ‘위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세르비아 여성 의사의 이러한 결정에는 성차별 및 정년 제도의 문제가 동시에 작용했다. 한국도 정년제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떨까.
▲정년제한 없는 미국‧정년 늘리는 추세의 유럽…각국 반응 달라
미국은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법적인 정년 제한이 없다. 내 몸이 ‘허락’하는 한 60세나 65세가 넘어 노인으로 간주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다. 호주는 1999년에 정년 제도를 폐지했고, 일본은 2004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까지는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 천국이라 불리는 유럽 역시 정년을 늘리는 추세다. 독일과 이탈리아, 덴마크 등지의 정년은 66~67세다.
많은 나라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온도차가 발생했다. 특히 유럽에서는 근로 연령이 늘어나자 연금을 받으며 쉴 기간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반발이 일어났다.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를 시작하는 한국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이 같은 온도차는 정년 제도의 개선이 ‘무엇을 위한 개선’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 국가의 정년제도 개선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처한 위기인 고령화의 충격을 완화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 평균수명이 늘수록 노인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나라들은 노인의 기준을 몇 세로 정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한 결과 60대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노동자들이 정년 연장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해당 제도가 ‘더 오랫동안 돈을 벌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가 아니라 ‘더 이상 노인이 아니니 더 일해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비슷한 배경을 깔고 있긴 하나,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개인연금 부족에 따른 복지부재와 연관이 깊다. 최근 호주 멜버른의 호주금융연구센터와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머서가 공동으로 조사한 ‘2015 멜버른-머서 글로벌팬션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25개국 가운데 24위에 불과했다. 이 조사는 연금 지급액의 적정성과 연금의 지속성, 민간연금의 완성도 등을 토대로 40여 가지 세부항목을 평가하는데, 한국은 인도 다음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상위권은 ‘예상대로’ 덴마크와 네덜란드, 호주(각각 1~3위)가 차지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은퇴 후 받는 연금이 불안하고, 때문에 더 오래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여기는 반면, 유럽은 은퇴해야만 ‘넉넉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더 오래 일해야 연금을 준다고 하니 반발하는 것이다.
▲韓 신입사원-30년 근속자 임금차이, 스웨덴의 3배
일자리가 무한대로 공급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누군가는 성전환까지 하면서 더 오래 일하겠다는 스타노즈시크의 선택을 이해하겠지만, 그녀의 정년이 1년 더 연장됨으로 인해 누군가는 신규채용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설사 스타노즈시크의 병원에 신규채용 된다 할지라도, 임금을 지불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떨치기 어렵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유럽국가 대부분은 20~30년 근무자의 임금이 신입사원의 2배를 넘지 않는다. 신입사원의 평균 임금을 100으로 볼 때, 20~30년 근속자의 임금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임금 연공성인데, 스웨덴은 이 임금 연공성이 110.8, 프랑스는 146.3, 영국은 156.7 정도다. 일본의 임금 연공성은 246.1로 높은 편인데, 한국은 무려 313에 달한다. 신입사원과 정년을 앞둔 근속자의 임금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평생 청년이나 신입사원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들도 언젠가는 정년을 앞둔 근속자가 되고, 나라가 지정한 ‘노인’이 된다. 그러나 당장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일부 청년들은 현재 정년을 앞둔 세대가 자신의 미래임을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년 연장을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나, 아버지의 정년이 연장되면서 아들의 취업이 어려워지거나 취업되더라도 낮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은 노동생산가능인구를 단순히 나이로 따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개인의 안정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세금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복지수준을 높이는 등의 추가적인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그 어느 쪽도 틀렸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다.
▲갈등을 넘어 화합이 필요한 시대
로버트 드 니로와 앤 해서웨이 주연의 영화 ‘인턴’은 은퇴 후 무료한 삶을 보내던 70세의 주인공 벤 휘태커(로버트 드 니로)가 인터넷 쇼핑몰에 시니어 인턴으로 취직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에피소드를 그렸다. 이 회사의 젊은 CEO인 줄스 오스틴(앤 해서웨이)은 나이 많고, 게다가 오지랖까지 넓은 휘태커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매사에 갈등이 폭발했다.
하지만 이 영화가 해피엔딩, 그러니까 인턴 휘태커와 CEO 오스틴의 화해와 화합으로 막을 내릴 수 있었던 비결은 노인을 채용하는 시니어 인턴제도와 ‘작은 일도 열정적으로 해결하는’ 휘태커의 태도에 있다. 국내에도 이미 CJ나 유한킴벌리 등의 대기업이 시니어 인턴제도를 운영하고 있긴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세대 간의 갈등이다.
권위적인 사내 문화에 길들여진 정년 세대와 오래된 경험과 노하우의 가치를 무시하는 청년 세대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이는 정년 연장의 또 다른 부작용이 될 것이 분명하다. 정년 연장을 포함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기가 막힌’ 노동 개혁제도의 등장도 물론 좋지만, 그 이전에 노인, 정년, 세대 등과 관련한 의식 간극을 줄여보는 노력을 시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