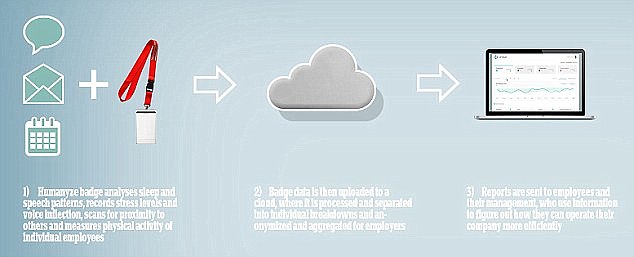회사가 당신의 일거수 일투족까지 감시한다면, 일을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
ID카드(입출입카드)로 사무실에 들어왔다 나가는 시간만 체크하던 과거는 오히려 애교에 가깝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책상 아래 혹은 사무실 조명 안에 기기를 설치해 직원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개발됐다.
지난해 영국 일간지 데일리텔레그래프 기자들은 자신의 책상 아래서 ‘아큐파이(Occupeye)’라고 적힌 플라스틱 기계를 발견했다. 이 기기는 무선 움직임 감시장치로, 열과 움직임 센서를 통해 무선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 웹사이트를 통해 직원들이 얼마나 오래 자리를 비웠는지를 통계로 전달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논란이 일자 데일리텔레그래프 측은 해당 장비를 책상에서 없앴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이러한 첨단기기의 사용이 인권침해 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고 있으며 직원 감시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마트센서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을 융합해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라이티드(Enlighted)의 CEO 조 코스텔로는 블룸버그와 한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빌딩 안으로 걸어 들어갈 때 감시가 가능한 센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다”고 말했다.
인라이티드의 스마트센서는 애초에 ‘감시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다. 센서가 작동할 때에만 전등이 켜지게 하고, 센서 작동이 꺼지면 자동으로 전력을 차단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로 개발됐다.
문제는 이것이 직원 감시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인라이티드 업체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인 설계 디자인 회사인 겐슬러는 뉴욕에 새로 지은 사옥의 조명에 이 업체의 센서 1000개를 설치했다.
만약 겐슬러의 A직원이 오전 10시에 일을 시작했다면, 그 전까지 A직원의 책상 위 혹은 주변 전등은 꺼져 있을 것이다. 겐슬러는 이 장비로 전력비용을 25% 절약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시에 회사는 '마음만 먹으면' 직원들이 얼마나 자리를 비우는지를 담은 데이터를 쉽게 손 안에 넣을 수 있게 됐다.
물론 겐슬러의 모든 직원이 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다. 겐슬러 직원 루크 론델(31)은 블룸버그와 한 인터뷰에서 “그것(센서) 때문에 귀찮거나 거슬리는 느낌은 없다”고 말했다.
전미노동인권협회(National Workrights Institute) 회장인 루이스 맬트비는 “고용주는 화장실을 제외한 사내에서 원하는 모든 종류의 모니터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가 익명으로 처리돼야 하며 직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