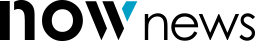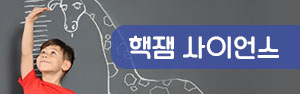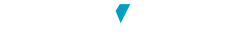‘콩루우스 키체네리’(Congruus kitcheneri)라는 학명이 붙여진 이 멸종한 나무타기 캥거루의 화석은 지난 2002년 널라버 평원의 틸라콜레오(주머니사자) 동굴에서 발굴됐다. 동굴에서 암수 한 쌍으로 발견된 이 종은 4만 년 전 멸종한 여러 몸집이 큰 동물들 중 하나에 속한다.
사실 이 종은 1989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지만, 당시 연구할 수 있는 화석은 두개골과 치아뿐이어서 이 종이 나무 위에서 생활했던 것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 종에는 원래 ‘왈라비아 키체네리’(Wallabia kitcheneri)라는 학명이 붙여졌었다.
반면 머독대의 내털리 워버턴 연구원과 플린더스대의 개빈 프리도 연구원이 발견한 이 나무타기 캥거루의 화석은 거의 완벽한 상태로 보존돼 있어 이 종이 어떻게 생활하고 움직였는지를 자세히 연구할 수 있었다.
워버턴 연구원은 “이 나무타기 캥거루 종은 다른 캥거루나 왈라비보다 길고 구부러진 발톱을 지닌 유별나게 긴 발가락을 지녔다”면서 “다른 캥거루들보다 길고 움직이기 쉬운 목은 먹기 좋은 나뭇잎을 찾기 위해 머리를 다양한 방향으로 뻗는데 유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 캥거루가 삶의 절반은 나무 위에서 생활헀다고 추정한다. 오늘날 살아 있는 극소수의 몸집이 작은 나무타기 캥거루 종도 나무 위에서 사는데 적응했지만, 이 종은 커다란 몸집을 갖고도 나무 위에서 살았다는 것이다.
워버턴 연구원에 따르면, 이 캥거루는 나무에 오를 때 코알라와 다른 몸집이 큰 영장류를 섞어놓은 것처럼 움직었다.
특히 이 나무타기 캥거루 화석이 발견된 지역은 현재 나무가 전혀 없는 널라버 평원이라는 점이 연구진의 이목을 끌었다. 널라버는 라틴어로 나무가 없다는 뜻이다. 이 일대는 원래 이 캥거루가 살았던 약 5만 년 전까지도 나무가 없는 평원으로 생각됐었다.
하지만 나무타기 캥거루가 발견되면서 이 지역은 한때 현재 모습과 전혀 달리 나무가 무성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워버턴 연구원은 덧붙였다.
덩치가 큰 이 캥거루가 왜 나무에 오르게 됐는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워버턴 연구원은 “나무를 타기 위해 몸을 들어올리는 데는 많은 에너지와 강한 근육이 필요했을 것”이라면서 “나무 위에는 그 노력만큼이나 좋은 먹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영국학사원이 발행하는 ‘로열 소사이어티 오픈 사이언스’(Royal Society Open Science) 최신호에 실렸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