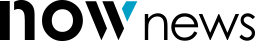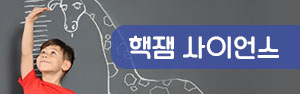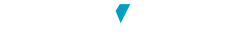지구 최남단 남극바다의 모습을 송두리째 바꾸어놓고 있는 범인은 지구온난화다.
중남미 언론은 "남극바다에서 자라는 해초가 늘어나면서 이미 대륙 쪽 일부 남극바다 해변은 푸르게 변한 곳이 많다"며 최근 이같이 보도했다.
남극바다에서 자라는 해초는 비교적 작은 종이지만 워낙 광범위한 구역을 덮게 되다 보니 녹색 바다를 만들어 버린다. 오염되지 않은 물에 해초의 색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잔뜩 이끼가 낀 곳도 이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과거 눈이 덮여 있던 지역에 이끼가 끼고 자라면서 이젠 남극인지 초원인지 사진만 보면 헷갈릴 정도다.
CSIC 해양과학연구소의 연구원 엔리케 이슬라는 "지구온난화로 남극이 과거보다 따뜻해진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해초가 자라는 구역이 남극으로 계속 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된다. 하얀 눈과 얼음은 빛을 반사해 대륙이 더위를 덜 먹게 하지만 해초가 깔려 짙은 색으로 변한 바다는 더위를 더 먹는다. 결과적으로 수온은 더 올라가게 된다.
이슬라는 "단순히 바다의 색이 바뀌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정적 영향이 체인처럼 연결된다"며 "남극의 빙하가 녹는 속도도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상 첫 폭염이 기록되는 등 남극에선 이미 체감할 수 있는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
CSIC 해양과학연구소에 따르면 남극대륙 서부에선 지난해 1월 평균 온도가 7도 가까이 높아지는 '폭염'이 기록됐다. 연구소는 "아직까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곳은 대륙의 끝자락 반도나 해변이지만 범위는 계속 확장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생태계의 변화도 걱정되는 부분이다. 남극의 추위가 사라지고 빙하가 녹아 땅이 드러난다면 대륙의 동물이 서식지를 옮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극에선 볼 수 없던 철새가 남극에 둥지를 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남극바다의 녹색화는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 동물의 배설물이 거름 역할을 하면서 해초나 이끼가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할 수 있어서다.
중남미 언론은 "지금까지 남극에서 발견된 해초구역의 60%가 펭귄의 서식지로부터 반경 5km 내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은 암시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사진=위크앤드 페르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