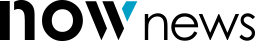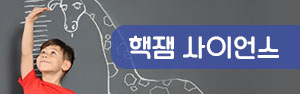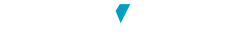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가 1만 3000명을 넘어서면서 감염 사망자 4920명에 대한 현재 치사율은 약 40%이다. 하지만 치료 시기가 늦어진다면 치사율의 증가도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수많은 희생자를 내며 맹위를 떨치고 있는 에볼라에도 의료활동 중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뒤 다시 복귀하는 간호사들의 사연이 공개돼 주목받고 있다.
◆다시 활약하는 에볼라 생존자들
그중 한 명은 올해 8월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에서 의료활동 중에 감염돼 모국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영국인 간호사 윌리엄 풀리(29). 회복 이후 의료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다시 시에라리온으로 돌아간 용감한 간호사이다.
그는 8월 23일에 입원해 9월 3일에 퇴원했고, 아직 승인되지 않은 치료제인 ‘지맵’(ZMapp)이 투여된 것이 병원 발표로 밝혀졌다.
풀리는 “면역이 생긴 나야말로 의료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특히 상황이 심각한 시에라리온으로 돌아간 것은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밝혔다.
또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22일 보도한 바로는 에볼라로부터 회복한 에이미 수바 역시 현재 ‘국경없는의사회’와 함께 라이베리아의 수도 몬로비아 병원에서 에볼라 환자에게 식사와 약을 제공하고, 아이들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의료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이곳에선 수바처럼 에볼라에서 회복한 생존자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들은 특수 보호복 착용 없이 수술복, 마스크, 장갑, 장화 등 가벼운 복장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다. 재감염에 대한 우려로 찬반양론이 있지만, 지금까지 다시 감염된 사람은 없다. ‘국경없는의사회’의 사회복지사 아테나 비스쿠시는 “그들이 평생 면역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번 에볼라 유행 기간에 다시 감염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생존자’보다 ‘무증상자’가 관건
이들처럼 에볼라 감염후 투병 끝에 면역력을 지니게 된 ‘생존자’도 있지만, 현재 에볼라에 감염돼 있으면서도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 ‘무증상자’(asymptomatic)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6년 가봉에서 에볼라가 유행할 때 감염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의 혈액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양성 반응자 중 무려 71%가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은 무증상자였다. 또 2000년에 발표된 연구논문에 의하면, 간호 등으로 에볼라 환자와 접촉한 사람의 46%가 양성이면서 무증상이었다.
프랑스 연구기관 IRD가 2010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가봉공화국 국민의 15.3%가 에볼라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 의학전문지 ‘란셋’(The Lancet)에 얼마 전에 논문을 기고한 미국 UT오스틴(텍사스대학 오스틴캠퍼스)의 스티브 벨런 박사는 “타고난 에볼라 면역 내성을 가진 무증상들을 연구하는 것은 치료법 개발을 촉진하고 에볼라 확산을 둔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에볼라 생존자의 혈액에서 혈청을 만들어내는 노력과 에볼라 항체를 바탕으로 한 백신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벨런 박사의 주장으로 혈청과 백신 개발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혈청은 같은 혈액형의 사람밖에 사용할 수 없고 효능이 얼마나 지속할지 불분명하며 백신을 개발해도 에볼라가 끊임없이 변이하고 있어 항체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 등이 그 이유다. 그래서 벨런 박사는 ‘생존자’보다 ‘무증상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벨런 박사는 “현재 서아프리카에서 행해지고 있는 혈청학적 조사와 함께, 무증상자의 면역체계에 대한 조속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감염자의 증상을 억제하고 면역성이 없는 사람들을 미리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 백신 개발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스티브 벨런 박사의 제안이 주목받고 실행에 옮겨지는 날은 올 것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에볼라를 막기 위한 새로운 활로가 펼쳐질 것인지 신중하고 신속한 검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출처=http://www.utexas.edu/news/2014/10/14/ebola-immunization/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