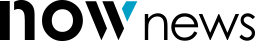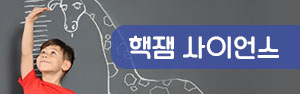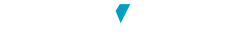동료를 구하는 이타적 행동 역시 마찬가지다. 대다수의 개미는 동료를 구하기보다 없어진 만큼 새로운 알을 낳는 방식으로 군집을 유지한다. 동료를 구하다가 더 많은 개미가 희생당하면 손해인 데다, 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하는 것 자체도 개미의 단순한 뇌로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미집이나 군집 자체가 공격당하지 않는 이상 개미 한 마리 정도 희생은 감수한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예외는 존재한다.
애리조나 대학의 크리스티나 크와피치 (Christina Kwapich)는 사막에서 씨앗을 모아 생존하는 개미의 일종인 베로메소르 페르간데이(Veromessor pergandei)를 관찰하던 중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다. 거미줄에 걸린 개미를 구하기 위해 동료 개미가 거미줄을 잘라내는 모습이다. (사진) 여러 동료의 구조 덕분에 이 개미는 거미 밥이 되는 대신 무사히 개미굴로 돌아갔다.
이렇게 동료를 구하는 개미는 16,000종에 달하는 개미 가운데 5종 정도에서만 보고됐다. 동료를 구하는 개미의 특징은 군집의 크기가 작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료를 구조하는 메타벨레 개미(Metabele ant)의 경우 하루에 알을 13개 정도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개미 한 마리의 가치가 매우 높다. 하지만 베로메소르 개미는 하루 650개 정도의 알을 낳고 하루에 먹이를 찾으러 나서는 개미만 3만 마리로 비교적 큰 군집을 이루기 때문에 곤충학자들에게도 뜻밖의 일이다.
연구팀은 이 행동을 자세히 연구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개미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개미가 위기에 빠지는 경우 화학 물질을 분비해 동료에게 구조 신호를 보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신호를 받은 개미는 동료에 붙은 거미줄을 떼어내 주는데, 이 행동은 개미굴에서도 똑같았다. 몸에 거미줄이 붙은 개미를 발견한 동료 개미는 거미줄을 몸에서 떼어준다.
연구팀은 이런 행동이 진화한 이유에 대해서 사막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먹이를 구해야 하는 생활 환경에서 한 마리의 일꾼도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오랜 세월 포식자인 거미와 공진화를 이룩하면서 이에 대응할 행동을 진화시킨 것도 이유일 것이다. 동료를 적극적으로 구해주는 곤충은 개미 이외에는 거의 보고된 적이 없다. 개미가 사회적 곤충의 대표인 이유를 여기서도 알 수 있다.
고든 정 칼럼니스트 jjy0501@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