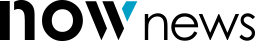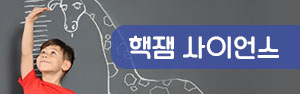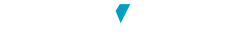보통 눈으로 보이는 것, 피부로 감촉이 느껴지는 것은 구체적으로 묘사가 쉬운 반면, 유독 콧속으로 전해지는 ‘냄새’는 구체적 설명 또는 묘사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이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다. 의학전문매체 메디컬 엑스프레스는 최근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과 네덜란드 라드바우드 대학 연구진이 각각 ‘두뇌 기능’과 ‘문화적 차이’ 측면에서 해당 문제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먼저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진은 뇌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일수록 특히 냄새에 대한 묘사력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환자들의 뇌를 MRI(자기공명영상장치)로 정상인의 뇌와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뇌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의 뇌는 정상인보다 유독 후각 뇌 부분(대뇌 반구에서 냄새를 맡는 것과 관련된 부위)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서 연구진은 시각, 청각에 비해 후각을 다스리는 뇌 연결고리가 유독 취약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이후 연구진은 다시 건강 상태가 정상인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해 추가 실험을 진행했다. 이들에게 특정 냄새를 맡게 한 뒤 이를 말로 묘사하도록 시키고 그동안 MRI(자기공명영상장치)와 EEG(뇌파검사장치)로 뇌 부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해본 것이다.
해당 실험에서 연구진은 참가자들이 냄새를 묘사할 때, 대뇌반구의 두 부분이 유독 크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는 뇌로 보내진 후각신호가 다시 인지신호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으로 여겨졌는데 특이하게도 다른 때보다 유독 신호가 꼬이거나 교란되는 경우가 많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후각신호를 인지하는 두뇌 안의 연결 프로세스가 취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려준다.
이와 대조적으로 네덜란드 라드바우드 대학 연구진은 문화적 차이 관점에서 해당 문제가 접근했다. 라드바우드 대학 연구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태국 남부와 말레이 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른 국가, 민족에 비해 유독 ‘냄새’와 관련된 어휘가 풍부한데 이는 두뇌 구조적 문제뿐 아니라, 성장·교육 환경의 차이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해당 연구결과는 각각 국제학술지 신경과학저널(Journal of Neuroscience)과 인지 저널(Journal Cognition)에 게재됐다.
자료사진=포토리아
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