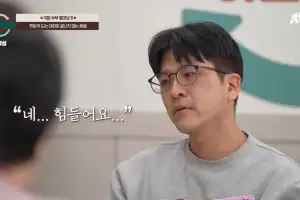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박자감각을 익힌 음악가들은 음악을 들을 때 팔다리뿐 아니라 두뇌마저 정확한 박자에 맞춰 ‘춤’을 추게 된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끈다.
최근 미국 뉴욕대학교 연구팀은 음악가들과 일반인들의 두뇌 활동을 비교분석한 결과, 같은 음악을 들었을 때에도 두 집단 사이에 서로 다른 두뇌 반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연구팀이 관찰한 구체적인 두뇌 활동은 ‘대뇌피질 진동’(Cortical oscillations)이라는 뉴런 작용이다. 이는 두뇌가 인식하고자 하는 소리의 박자에 맞춰 뉴런의 신호 발생 주기를 변화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그동안 해당 현상은 음악보다는 말소리를 인식·처리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예를 들어 수많은 소음이 섞여있는 공간에서 원하는 사람의 말소리만을 청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대뇌피질 진동이 해당 말소리의 박자에 동조하기 때문이다.
박사과정 연구원 키스 돌링은 “기존의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인간이 다른 사람의 말소리를 인식할 경우 그 대뇌피질 진동이 4~5회라는 ‘음절주기’(1초당 음절이 발음되는 횟수)에 맞춰 전반적으로 재조정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고 설명한다.
연구팀이 실시한 이번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동조현상이 말소리가 아닌 음악을 들을 때에도 일어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돌링과 데이비드 페펠 뉴욕대 교수는 27명의 음악가와 12명의 일반인에게 세 가지 클래식 곡을 여러 차례 들려주면서 그들의 뉴런 활동을 분석했다. 참여한 음악가들은 클래식뿐만 아니라 여러 음악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고루 포함하도록 구성했다.
관찰 결과 음악가와 일반인 모두 음악의 박자에 맞춰 대뇌피질 진동이 동조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음악가들의 경우 일반인들과 달리 초당 1박자 미만의 아주 느린 속도에도 잘 반응한다는 차이가 있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돌링은 “일반인들은 음 사이의 간격이 멀수록 이들을 하나의 가락으로 묶어 인식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테면 2초라는 긴 간격으로 음이 들릴 경우 일반인들은 이들이 하나의 리듬이 아니라 서로 상관없는 개별적 소리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더 나아가 이 동조 현상은 개인의 ‘음악훈련’ 수준이 높을수록 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란은 “음악적 훈련의 강도와 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동조의 수준도 높았다”고 말한다.
또한 연구팀은 개인의 ‘음 정보 처리능력’ 또한 동조현상과 관련돼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곡의 특정 음정을 왜곡해 들려주는 실험도 진행했다. 이들은 이러한 음악을 들려준 뒤 참가자들에게 음 왜곡을 포착했는지, 포착했다면 그 음이 원래 음정보다 높거나 낮은지를 물어봤다.
그 결과 동조현상이 강한 사람일수록 차이를 더 정확하게 지적해냈으며, 따라서 이 현상은 박자뿐 아니라 음악의 기타 세부적 요소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과도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연구팀은 향후 같은 음악을 반복해서 들을 경우 대뇌피질 진동의 동조능력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연구할 계획이다. 돌링은 “이러한 훈련을 받을 경우 일반인들의 뇌파 동조가 음악가들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지 확인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포토리아
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